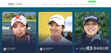1961년 박정희가 주도했던 5.16 군사 반란은 당시 제3세계에 흔했던 여느 쿠데타와는 사뭇 달랐다. 우리의 유신은 메이지유신 전후의 사무라이들과 황도파 젊은 장교들이 주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쇼와 유신’의 한국판 재탕이었다. 일본의 유신이 폭주해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고 일본 국민을 인질로 삼아 위기에 이르렀듯, 박정희의 유신도 똑같이 국민 살해의 임계점에 도달했었다. 부마항쟁 당시 몇백만을 죽여도 괜찮다는 박정희의 뜻을 가까스로 막아낸 것은 의사가 아닌 최후의 유신 지사(志士) 김재규였다.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헌정 중단 사태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하며 일본 천황처럼 초법적 존재가 된 것을 말한다. 그는 유신 체제를 '한국식 민주주의'라며 포장했으나 5·16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명분처럼 정권을 민간에 이양할 뜻이 전혀 없어 보였다.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제명 파동이 터지고, 부마 민주항쟁도 일어나면서 유신 체제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사실 탄생과 몰락의 궤를 함께 하는 유신의 특성상 박정희 정권의 종말은 거의 정해진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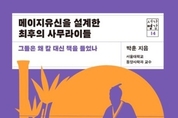
1853년 미국 해군 증기선 함대가 도쿄 근해에 나타나면서 일본의 모든 것이 변했다.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최강대국 청나라가 아편전쟁 이후 내부분열로 흔들리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자 에도 막부는 혹시 있을지 모를 서구의 침략에 긴장한 상태였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미일수호통상조약’으로 침략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개항 약속이나 외국인 신분 보장 등 민감한 사안이 대두되었다. 에도 막부는 서양과 통상조약을 맺으려 했다. 막부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실무진이라면 최종 결정은 천황의 몫이었기 때문에 막부는 교토 황궁의 재가를 기다렸다. 그런데 당시 고메이 천황이 서구인이 싫다며 수결을 미뤘고 천황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막부는 천황을 제치고 조약에 서명하고 만다. 미군 함대는 속절없이 돌아가고 일본 국내 여론은 들끓었다. 외적을 막아야 할 막부가 굴욕 외교를 했다며 강경파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막부의 신분제에 복종하던 하급 무사들에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궁핍이 극에 달하자 울분에 찬 탈번이 잇달았다. 오랜 세월 전쟁 없이 평화롭던 일본 열도에 닥친 외세 침략의 공포감은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로 손해를 보게 된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다